
3년간 논의에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현재 열리고 있는 유엔환경총회(UNEA-7)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세계 193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환경총회는 8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총회에는 시작부터 기후위기 대응방향을 놓고 각국이 입장차를 드러내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기후기술'로 지구 기온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국가들은 기술보다 배출감축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며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이번 환경총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진전 여부로 꼽힌다. 환경전문매체 몽가베이에 따르면,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다시 시작되면서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플라스틱 산업 비중이 큰 국가들은 감축량을 명문화시키는 것에 반대하지만, 유럽연합(EU)와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생산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도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플라스틱오염 대응체계 구축이 장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해채굴 문제 역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가 심해채굴을 4년간 유예하며 '생태계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자, 여러 국가가 글로벌 모라토리엄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해저 생태계 교란, 생물다양성 손실 등 회복이 어려운 피해 가능성은 과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일부 국가는 태양 복사량을 줄여 지구 온도를 낮추는 '기후기술'을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기후기술이 예측불가능한 기후변화와 지역별 피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가디언은 "아프리카가 이를 '기후정의' 문제로 규정하며, 배출감축보다 기술에 의존하는 접근 자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자연복원 의무화, 과불화화합물(PFAS)·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 규제강화, 사막화 대응, 순환경제 전환 등이 이번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환경총회는 환경분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곳에서 도출되는 합의는 각국의 정책과 향후 기후·환경관련 국제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영국 가디언은 "기후위기 해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균열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점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총회는 이달 12일까지 이어지며, 핵심의제들에 대한 결론이 향후 글로벌 환경규범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 김혜지 기자 gpwl0218@newstree.kr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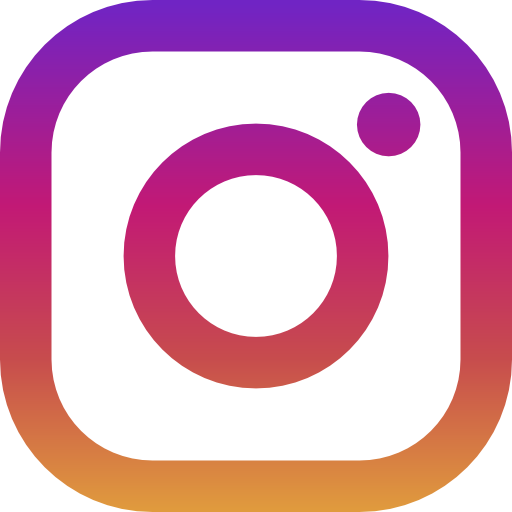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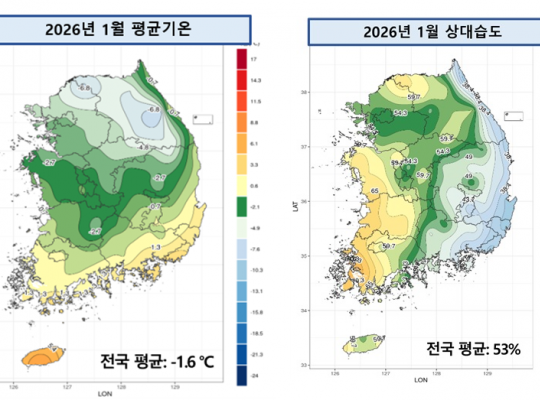










 최신뉴스 보기
최신뉴스 보기